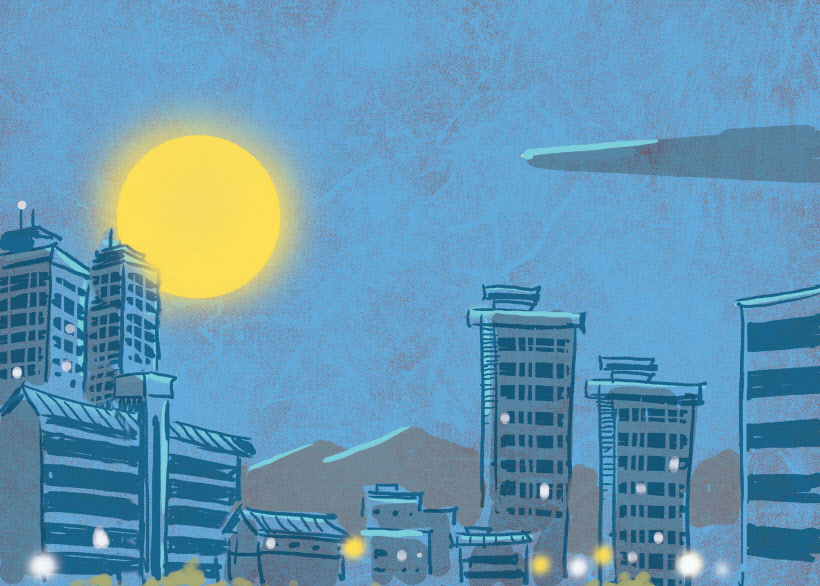 |
잠투정 아기 달래는 엄마의 목소리
할아버지 혈액순환 허벅지 때리기
친정엄마와 낯선 할머니 벤치대화
그래서 가엾고 곤한 냄새가 난다…
창문 닫고 자야할 가을 다가와 다행
 |
| 김서령 소설가 |
며칠 전 새벽녘에 잠을 깼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것을 보다 잠이 들어서 처음에는 나를 깨운 것이 빗소리인 줄 알았다. 찰박, 찰박…… 잠시 후에 또 찰박. 어딘가서 물이 떨어지는 건가. 발코니 문을 열어두었는데 어딘가로 물이 새고 있나. 개수대 수도를 덜 잠갔나. 찰박찰박 소리는 간헐적으로 이어졌다. 언뜻 내다본 창밖에는 이미 환한 새벽빛이 올라 있었고 비는 그친 후였다. 주방 수도꼭지도 잘 잠겨 있고 발코니도 멀쩡했다. 다시 창밖을 내다보았다. 비가 씻어낸 여름의 새벽 풍경은 청량하기 그지없었다. 더워도, 밤중 소음이 있어도 여름만큼 예쁜 계절이 또 어디 있을까. 이렇게 예쁜 초록을 또 어디에서 볼 수 있을까. 소음의 근원지는 찾지 못한 채 창문을 닫으려던 찰나, 다시 찰박 소리가 들려왔다. 벤치였다.
놀랍게도 할아버지 한 분이었다. 반바지를 입고 이른 산책을 나온 어르신이 벤치에 앉아 허벅지를 찰박찰박 때리고 있었다. 대체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가지 않아 나는 한참을 쳐다보았다. 물안개가 나직하게 내려앉은 화단 옆 벤치에 앉아 반바지 자락을 허벅지 끝까지 끌어올리고 허벅지를 소리 나게 때리고 있다니. 한참 만에야 그건 그냥, 혈액순환을 위한 할아버지 나름의 운동법이라는 걸 깨달았다. 그래서 웃음이 터지고야 말았다. 마침 젖은 바람도 서늘해 나는 창문을 닫고 침대에 도로 누웠다.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그 광경이 쉬이 눈앞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몇 달 전 친정엄마는 우리 집에 다니러 왔다가 새벽녘 혼자 산책을 나섰다. TV라도 틀면 곤히 자는 딸네 식구들 깨울 것이 빤하니 아무도 몰래 조용히 나선 것이었다. 아침에 잠을 깨 엄마가 없다는 것을 알고 창문을 열어보니 벤치에 웬 낯선 할머니 한 분과 앉아있는 것이 보였다. "엄마, 들어와요!" 내 말에 손만 흔들어 보이고는 한참이 지나도 들어오지 않았다. 엄마는 여전히 모르는 할머니와 벤치에 앉아있었다. 아침을 먹자고, 몇 번을 조른 후에야 들어온 엄마가 가만가만 이야기를 해주었다.
"아들네서 살다가 며느리랑 사이가 안 좋아져서 딸네로 옮겼대. 근데 딸네랑도 안 좋아서 아들이랑 딸이 돈을 보태 여기다 전세를 얻어줬나 봐. 옛날에야 할아버지랑 살았겠지. 그러다 혼자되니까 아들네로 딸네로 돌다가 결국 혼자 사는 거지. 외롭대. 여긴 젊은 부부들만 살아서 노인네들도 없다고, 나랑 조금만 더 놀다 가자, 조금만 더 있다 가자, 그래서 붙잡혀 있었지." 나는 공연히 조금 찡해져서 "그럼 아침 드시고 가라 그러지." 그랬더니 엄마가 웃었다. "뭘, 처음 보는 노인네인데. 아이고, 자식들한테 좀 애살 있게 잘하지, 늙었다고 잔소리나 풀풀하고 그러면 누가 좋아한다고."
새벽은 많은 이야기를 한다. 잠 못 이룬 사람들이 먼저 걷고, 바쁜 사람들이 먼저 걸으며 속엣말을 훌훌 아무 데나 떨어뜨린다. 그래서 새벽엔 가엾고 곤한 냄새가 난다. 나는 이불을 코끝까지 끌어당기며 이제 곧 창문을 꼭꼭 걸어잠그고 자야 할 가을이 부쩍 다가와 다행이란 생각을 했다.
/김서령 소설가
# 키워드
경인 WIDE
디지털스페셜
디지털 스페셜
동영상·데이터 시각화 중심의 색다른 뉴스









![[풍경이 있는 에세이]새벽이 전하는 이야기들](http://www.kyeongin.com/mnt/webdata/content/202404/1223122.jpg)
![[풍경이 있는 에세이]새벽이 전하는 이야기들](http://www.kyeongin.com/mnt/webdata/content/202402/23122.jpg)
![[풍경이 있는 에세이]새벽이 전하는 이야기들](http://www.kyeongin.com/mnt/webdata/content/202402/4444.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