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식의 다시 보는 한국 프로야구 명장면·3]1984년 '마무리 투수' 도입한 OB
경인일보
발행일 2018-04-17 제19면
박철순 '공백' 분업화 단초가 되다
年 200이닝 이상 소화 선발 희생 커
김성근 감독 투수 능력 끌어 올리려
윤석환에 후방 맡겨 로테이션 완성
1984년은 한국프로야구사에서 각 팀의 에이스들이 가장 처절한 희생을 감수해야 했던 해였다. 팀당 100경기가 치러지던 그 해 무려 여섯 명의 투수들이 각 팀의 운명을 짊어지고 200이닝 이상을 던져야 했기 때문이다.
물론 200이닝 투구라는 것이 투수 혹사의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순 없다. 오히려 200이닝을 소화한다는 것은 내구력과 안정성을 겸비한 완성형 선발투수, 즉 진정한 에이스의 자격을 갖추었음을 입증하는 단면으로 인정되기도 한다.
하지만 최소한 2000년대 이후의 200이닝이란 온전히 선발투수로서 일정한 등판간격과 투구수 관리를 받으며 만들어내는 기록들이라는 점, 그리고 경기수가 130경기 안팎으로 늘어난 환경이 전제된다는 점에서 30여 년 전과는 다른 이야기가 된다.
1984년, 200이닝을 넘겼던 여섯 명의 투수들은 선발등판경기의 절반 이상을 완투했음에도, 대개 선발로서 등판했던 경기의 수는 전체 출장경기수의 절반 정도 밖에는 되지 않았다.
길어야 사나흘에 한 번씩 마운드에 올라 별일 없으면 완투를 해야 했고, 쉬는 날에도 경기 흐름이 묘하다 싶으면 구원 등판해 마침표를 찍어주는 것이 에이스의 역할이라는 데 이견을 가진 사람은 거의 없었다.
이런 흐름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이단적인 투수운용을 했던 팀이 있었다. 바로 OB다. 그해 라이벌 팀 삼성으로 자리를 옮긴 김영덕 감독의 뒤를 이어 1984년 OB의 2대 감독으로 취임한 김성근 감독은 예나 지금이나 열악한 조건 속에서 최선의 대안을 찾는 데 최고의 능력을 가진 이였다.
두 해 전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우승을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인 박철순의 허리부상은 쉽게 호전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었고, '박철순 급'의 에이스란 훈련을 통해 끌어올릴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OB는 원년 멤버 계형철, 박상열과 신예 장호연, 최일언, 김진욱 등 좋은 재목을 많이 가지고 있었지만 그 중에서 박철순의 대역을 할 수 있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김성근 감독은 결국 여러 명의 투수들이 각자 가장 강력한 순간만을 마운드 위에 설 수 있도록 치밀한 분업 체계를 설계했다. 그리고 그 핵심은 '선발로 나서지 않으면서 전천후로 후방지원을 하는 투수'인 윤석환이었다.
선린상고 3학년이던 1979년 대통령배 고교야구대회 결승전에서 부산상고의 윤학길과 맞대결해 15-1로 이겨 우승을 이끌며 주목을 끌었던 윤석환은 성균관대를 거쳐 그 해 처음 프로무대로 들어섰다.
좌투수로서 빠른 공과 안정된 제구력도 겸비하고 있었고, 무엇보다도 낙천적인 성격이 두드러지는 선수였다. 신인으로서 연투의 경험이 적다는 것이 약점이었지만, 짧은 이닝만 던지게 한다면 장점들을 모두 살릴 수 있다는 것이 김성근 감독의 판단이었다.
그렇게 강속구 투수 계형철과 김진욱,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포크볼을 던지던 최일언 그리고 제구력으로 승부하는 박상열과 장호연이 돌아가며 선발 마운드에 오르는 '로테이션'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누구든 경기 중 문제가 생겼을 때는 상부상조하며 서로를 갉아먹는 대신 늘 대기하고 있던 윤석환에게 공을 넘기는 분업체계도 자리를 잡았다.
한국야구가 마무리투수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그럼으로써 에이스들의 어깨를 아껴주기 시작한 것은 그로부터 다시 몇 해가 지난 뒤부터였다.
1980년대 후반의 김용수는 약체팀을 최약체로 떨어뜨리지 않는 것이 마무리라는 점을 증명했고, 90년대 초반의 송진우와 선동열은 강팀을 최강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또한 마무리라는 점을 증명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만약, 1984년에 OB가 조금 더 전진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한두 해라도 일찍 마무리의 중요성을 발견하고, 한두 해라도 먼저 투수들을 '아낀다'는 개념이 자리 잡았다면, 우리 기억 속에 남은 숱한 영웅들의 이름 앞에서 적지 않은 '비운'의 딱지들이 지워질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 때문에 말이다.
/김은식 야구작가
김성근 감독 투수 능력 끌어 올리려
윤석환에 후방 맡겨 로테이션 완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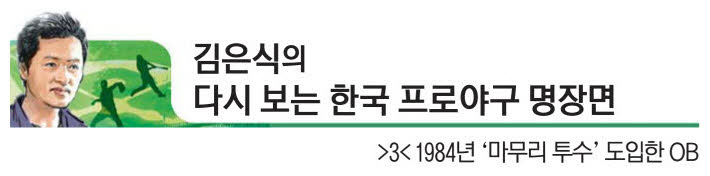 |
물론 200이닝 투구라는 것이 투수 혹사의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순 없다. 오히려 200이닝을 소화한다는 것은 내구력과 안정성을 겸비한 완성형 선발투수, 즉 진정한 에이스의 자격을 갖추었음을 입증하는 단면으로 인정되기도 한다.
하지만 최소한 2000년대 이후의 200이닝이란 온전히 선발투수로서 일정한 등판간격과 투구수 관리를 받으며 만들어내는 기록들이라는 점, 그리고 경기수가 130경기 안팎으로 늘어난 환경이 전제된다는 점에서 30여 년 전과는 다른 이야기가 된다.
1984년, 200이닝을 넘겼던 여섯 명의 투수들은 선발등판경기의 절반 이상을 완투했음에도, 대개 선발로서 등판했던 경기의 수는 전체 출장경기수의 절반 정도 밖에는 되지 않았다.
길어야 사나흘에 한 번씩 마운드에 올라 별일 없으면 완투를 해야 했고, 쉬는 날에도 경기 흐름이 묘하다 싶으면 구원 등판해 마침표를 찍어주는 것이 에이스의 역할이라는 데 이견을 가진 사람은 거의 없었다.
이런 흐름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이단적인 투수운용을 했던 팀이 있었다. 바로 OB다. 그해 라이벌 팀 삼성으로 자리를 옮긴 김영덕 감독의 뒤를 이어 1984년 OB의 2대 감독으로 취임한 김성근 감독은 예나 지금이나 열악한 조건 속에서 최선의 대안을 찾는 데 최고의 능력을 가진 이였다.
두 해 전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우승을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인 박철순의 허리부상은 쉽게 호전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었고, '박철순 급'의 에이스란 훈련을 통해 끌어올릴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OB는 원년 멤버 계형철, 박상열과 신예 장호연, 최일언, 김진욱 등 좋은 재목을 많이 가지고 있었지만 그 중에서 박철순의 대역을 할 수 있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김성근 감독은 결국 여러 명의 투수들이 각자 가장 강력한 순간만을 마운드 위에 설 수 있도록 치밀한 분업 체계를 설계했다. 그리고 그 핵심은 '선발로 나서지 않으면서 전천후로 후방지원을 하는 투수'인 윤석환이었다.
선린상고 3학년이던 1979년 대통령배 고교야구대회 결승전에서 부산상고의 윤학길과 맞대결해 15-1로 이겨 우승을 이끌며 주목을 끌었던 윤석환은 성균관대를 거쳐 그 해 처음 프로무대로 들어섰다.
좌투수로서 빠른 공과 안정된 제구력도 겸비하고 있었고, 무엇보다도 낙천적인 성격이 두드러지는 선수였다. 신인으로서 연투의 경험이 적다는 것이 약점이었지만, 짧은 이닝만 던지게 한다면 장점들을 모두 살릴 수 있다는 것이 김성근 감독의 판단이었다.
그렇게 강속구 투수 계형철과 김진욱,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포크볼을 던지던 최일언 그리고 제구력으로 승부하는 박상열과 장호연이 돌아가며 선발 마운드에 오르는 '로테이션'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누구든 경기 중 문제가 생겼을 때는 상부상조하며 서로를 갉아먹는 대신 늘 대기하고 있던 윤석환에게 공을 넘기는 분업체계도 자리를 잡았다.
한국야구가 마무리투수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그럼으로써 에이스들의 어깨를 아껴주기 시작한 것은 그로부터 다시 몇 해가 지난 뒤부터였다.
1980년대 후반의 김용수는 약체팀을 최약체로 떨어뜨리지 않는 것이 마무리라는 점을 증명했고, 90년대 초반의 송진우와 선동열은 강팀을 최강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또한 마무리라는 점을 증명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만약, 1984년에 OB가 조금 더 전진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한두 해라도 일찍 마무리의 중요성을 발견하고, 한두 해라도 먼저 투수들을 '아낀다'는 개념이 자리 잡았다면, 우리 기억 속에 남은 숱한 영웅들의 이름 앞에서 적지 않은 '비운'의 딱지들이 지워질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 때문에 말이다.
/김은식 야구작가
관련기사
경인 WIDE
디지털스페셜
디지털 스페셜
동영상·데이터 시각화 중심의 색다른 뉴스









![[김은식의 다시 보는 한국 프로야구 명장면·3]1984년 '마무리 투수' 도입한 OB](http://www.kyeongin.com/mnt/webdata/content/202405/dhkdldm.jpg)
![[김은식의 다시 보는 한국 프로야구 명장면·3]1984년 '마무리 투수' 도입한 OB](http://www.kyeongin.com/mnt/webdata/content/202405/ㄴㅇㅁㄴㅁㅇㅁㄴㅇㅁㄴㅇㅁㄴㅇ.jpg)
![[김은식의 다시 보는 한국 프로야구 명장면·3]1984년 '마무리 투수' 도입한 OB](http://www.kyeongin.com/mnt/webdata/content/202404/1223122.jpg)
![[김은식의 다시 보는 한국 프로야구 명장면·3]1984년 '마무리 투수' 도입한 OB](http://www.kyeongin.com/mnt/webdata/content/202402/2312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