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식의 다시 보는 한국 프로야구 명장면·12]1991년, 롯데가 처음 달성한 '백만 관중'
경인일보
발행일 2018-06-19 제19면
부산야구, 두 번째 봄이 찾아오다
1984년 우승후 열기 사그라졌지만
박동희·장효조·김민호 등 맹활약
'탄탄해진 전력' 팬들 발길 줄이어
1991년 9월 15일, 롯데는 그 해의 마지막 홈경기에 해태를 불러 들여 5-1로 승리했다.
시즌 내내 시달렸던 난적이었고, 그날의 승리를 합해도 6승 12패의 적자였지만, 어쨌든 깔끔한 마침표였다.
마운드에서는 오랜만에 제구가 잡힌 박동희가 해태 타선을 힘으로 짓눌렀고, 타석에서는 그 전 해 트레이드의 정신적 충격을 벗어나지 못한 채 '처음 3할 이하로 떨어져보는' 수모를 당했던 타격의 달인 장효조가 대타로 출장해 홈런을 날리며 승부의 쐐기를 박았다.
그리고 그날, 롯데는 한국 프로야구사에 또 하나의 빛나는 기록을 세우게 된다.
일요일이었던 그 날 관중석을 가득 채우며 그 해 100만 1천920명 홈관중을 기록해 첫 번째 '백만 관중 동원 팀'이 된 것이다.
그 해 롯데가 백만 관중을 야구장으로 불러 모을 수 있었던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다.
우선 만화에서나 볼 수 있을 것 같던 극적인 우승을 이루어낸 1984년을 기점으로 폭발한 부산의 야구열기가 있었고, 1985년 10월에 완공된 3만 석 규모의 사직야구장이 그 열기를 그득히 받아내는 그릇이 되고 있었다.
하지만 1984년의 우승 뒤 무려 6년 동안 가을야구에서 소외된 채 입맛만 다셔야 했고, 1989년에는 1984년 드라마의 주인공으로서 롯데와 부산 야구의 상징이기도 했던 최동원을 쫓아내듯 떠나보내는 자책골로 끓어오르던 열기에 찬물이 끼얹어지기도 했다.
최동원만큼의 존재감을 보여주는 투수도 찾기 어려웠고, 최동원에 이어 떠나보냈던 김용철만큼의 파괴력을 보여주는 타자도 다시 만나기 어려웠다.
1991년, 부산야구에는 다시 봄기운이 돌아왔다. 박동희가 14승을 올리며 아마추어 시절부터 달고 다니던 '제 2의 최동원'이라는 수식어가 야구팬들 머릿속에 떠오르기 시작했다.
그리고 지난 시즌 2승으로 삐끗했던 윤학길이 17승을 기록하며 제자리로 돌아왔다. 거기에 3년차 김청수와 고졸신인 김태형이 각각 두 자리 승수를 올리며 롯데는 일약 네 명의 10승대 선발투수를 보유한 팀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타선도 제법 안정된 해였다. 4번 타자 김민호가 20홈런과 3할을 기록하며 중심을 잡았고, 투수에서 전향한 김응국이 3할과 25도루를 기록하며 짝을 이루었다.
거기에 타격의 달인 장효조가 부활하며 3할 4푼대의 고타율로 제 2의 전성기를 시작했고, 신인 박정태와 전준호가 각각 타점과 도루로 팀을 이끌며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시작했다.
특히 속 터지도록 느긋했던 강병철 감독의 배짱은, 막 피어오르는 숯불 같던 선수들의 열기와 어우러지면서 묘하게도 그 해만큼은 궁합이 맞았다. 역전패를 거듭하면서도 선발 로테이션은 무너지지 않았고, 선수들 역시 오늘 지면 내일 이긴다는 자신감으로 조급한 모험을 자제했다.
그렇게 롯데의 전력은 오히려 후반기가 되면서 더 단단해져갔고, 8월 14일에 반 경기차로 앞서가던 LG를 잠실에서 5-1로 잡고 4위로 올라선 뒤 한 번도 그 아래로 떨어지지 않은 채 시즌을 완주해내며 가을야구의 티켓을 손에 쥘 수 있었다.
물론 그 해도 마땅한 마무리투수를 만들지 못한 약점은 여전했고, 그래서 시즌 내내 최강의 자리를 넘볼 수는 없었다.
하지만 매 경기 희망의 이유를 떠올릴 수 있었고, 지더라도 허탈하게 경기장을 빠져나오지 않을 수 있었던 그해, 부산의 팬들이 야구장을 찾는 발걸음에 거리낄 것은 없었다.
/김은식 야구작가
박동희·장효조·김민호 등 맹활약
'탄탄해진 전력' 팬들 발길 줄이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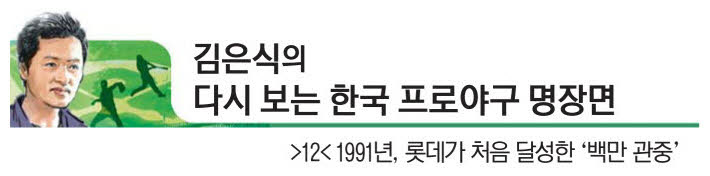 |
시즌 내내 시달렸던 난적이었고, 그날의 승리를 합해도 6승 12패의 적자였지만, 어쨌든 깔끔한 마침표였다.
마운드에서는 오랜만에 제구가 잡힌 박동희가 해태 타선을 힘으로 짓눌렀고, 타석에서는 그 전 해 트레이드의 정신적 충격을 벗어나지 못한 채 '처음 3할 이하로 떨어져보는' 수모를 당했던 타격의 달인 장효조가 대타로 출장해 홈런을 날리며 승부의 쐐기를 박았다.
그리고 그날, 롯데는 한국 프로야구사에 또 하나의 빛나는 기록을 세우게 된다.
일요일이었던 그 날 관중석을 가득 채우며 그 해 100만 1천920명 홈관중을 기록해 첫 번째 '백만 관중 동원 팀'이 된 것이다.
그 해 롯데가 백만 관중을 야구장으로 불러 모을 수 있었던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다.
우선 만화에서나 볼 수 있을 것 같던 극적인 우승을 이루어낸 1984년을 기점으로 폭발한 부산의 야구열기가 있었고, 1985년 10월에 완공된 3만 석 규모의 사직야구장이 그 열기를 그득히 받아내는 그릇이 되고 있었다.
하지만 1984년의 우승 뒤 무려 6년 동안 가을야구에서 소외된 채 입맛만 다셔야 했고, 1989년에는 1984년 드라마의 주인공으로서 롯데와 부산 야구의 상징이기도 했던 최동원을 쫓아내듯 떠나보내는 자책골로 끓어오르던 열기에 찬물이 끼얹어지기도 했다.
최동원만큼의 존재감을 보여주는 투수도 찾기 어려웠고, 최동원에 이어 떠나보냈던 김용철만큼의 파괴력을 보여주는 타자도 다시 만나기 어려웠다.
1991년, 부산야구에는 다시 봄기운이 돌아왔다. 박동희가 14승을 올리며 아마추어 시절부터 달고 다니던 '제 2의 최동원'이라는 수식어가 야구팬들 머릿속에 떠오르기 시작했다.
그리고 지난 시즌 2승으로 삐끗했던 윤학길이 17승을 기록하며 제자리로 돌아왔다. 거기에 3년차 김청수와 고졸신인 김태형이 각각 두 자리 승수를 올리며 롯데는 일약 네 명의 10승대 선발투수를 보유한 팀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타선도 제법 안정된 해였다. 4번 타자 김민호가 20홈런과 3할을 기록하며 중심을 잡았고, 투수에서 전향한 김응국이 3할과 25도루를 기록하며 짝을 이루었다.
거기에 타격의 달인 장효조가 부활하며 3할 4푼대의 고타율로 제 2의 전성기를 시작했고, 신인 박정태와 전준호가 각각 타점과 도루로 팀을 이끌며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시작했다.
특히 속 터지도록 느긋했던 강병철 감독의 배짱은, 막 피어오르는 숯불 같던 선수들의 열기와 어우러지면서 묘하게도 그 해만큼은 궁합이 맞았다. 역전패를 거듭하면서도 선발 로테이션은 무너지지 않았고, 선수들 역시 오늘 지면 내일 이긴다는 자신감으로 조급한 모험을 자제했다.
그렇게 롯데의 전력은 오히려 후반기가 되면서 더 단단해져갔고, 8월 14일에 반 경기차로 앞서가던 LG를 잠실에서 5-1로 잡고 4위로 올라선 뒤 한 번도 그 아래로 떨어지지 않은 채 시즌을 완주해내며 가을야구의 티켓을 손에 쥘 수 있었다.
물론 그 해도 마땅한 마무리투수를 만들지 못한 약점은 여전했고, 그래서 시즌 내내 최강의 자리를 넘볼 수는 없었다.
하지만 매 경기 희망의 이유를 떠올릴 수 있었고, 지더라도 허탈하게 경기장을 빠져나오지 않을 수 있었던 그해, 부산의 팬들이 야구장을 찾는 발걸음에 거리낄 것은 없었다.
/김은식 야구작가
관련기사
경인 WIDE
디지털스페셜
디지털 스페셜
동영상·데이터 시각화 중심의 색다른 뉴스

![[단독]](http://www.kyeongin.com/mnt/webdata/content/202405/에117.jpg)







![[김은식의 다시 보는 한국 프로야구 명장면·12]1991년, 롯데가 처음 달성한 '백만 관중'](http://www.kyeongin.com/mnt/webdata/content/202405/dhkdldm.jpg)
![[김은식의 다시 보는 한국 프로야구 명장면·12]1991년, 롯데가 처음 달성한 '백만 관중'](http://www.kyeongin.com/mnt/webdata/content/202405/ㄴㅇㅁㄴㅁㅇㅁㄴㅇㅁㄴㅇㅁㄴㅇ.jpg)
![[김은식의 다시 보는 한국 프로야구 명장면·12]1991년, 롯데가 처음 달성한 '백만 관중'](http://www.kyeongin.com/mnt/webdata/content/202404/1223122.jpg)
![[김은식의 다시 보는 한국 프로야구 명장면·12]1991년, 롯데가 처음 달성한 '백만 관중'](http://www.kyeongin.com/mnt/webdata/content/202402/23122.jpg)















